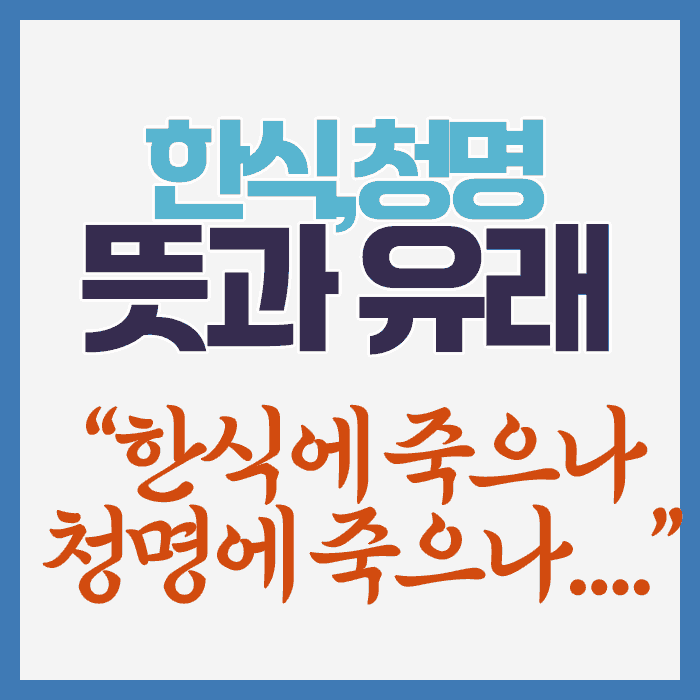티스토리 뷰
Contents
이 글은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한식'의 날과 유래, 풍속, 그리고 관련된 속담의 뜻에 대해서 다루며, 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한식이란?
한식(寒食)은 금연일(禁烟日), 숙식(熟食), 냉절(冷節)이라고도 하며,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한국의4대 명절중 하나입니다.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 4월 5일 혹은 6일에 매년 한식을 기념합니다.
2024년 한식(寒食)은 4월 5일입니다.
2024년 청명(淸明)은 4월 4일 입니다.
특이하게도, 다른 명절들이 음력으로 날짜를 지정하는 반면, 한식은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한식의 유래 : '한식'이란 용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한식'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면, 옛날에는 이 날에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습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1. 조선시대 '개화의식' 유래설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의 이름은 '개화(改火)'라고 합니다. 이 의식은 나무를 비벼 새로운 불을 만들고, 그 새로운 불로 오래된 불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대의 관습은 '동국세시기'라는 문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오래된 불은 생명력이 없다고 믿었고,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불을 사용하도록 개화 의식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력과 기운을 가져오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밥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찬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찬밥을 먹는 습관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식이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식의 유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2-2. 중국 춘추시대 '개자추' 유래설
유래설 중에서 주목할 만한 하나는 '개자추'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자추'는 중국 춘추시대에 진나라의 충신으로 살았던 인물로, 그의 헌신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진문공'과 함께 19년 동안 굶주림과 고난을 견뎌내며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진문공이 굶주릴 때는 자신의 허벅지살까지 떼어내어 먹인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문공'이 군주가 된 후에 불행하게도 '개자추'를 잊고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망한 '개자추'는 산에 은거하여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문공'은 '개자추'를 산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 불을 피웠지만, 결국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산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후, 그는 나무를 껴안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후, '진문공'은 그의 충신을 애도하며 한 해에 이날 하루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찬밥을 먹는 풍속이 생겼다는 것이 한식의 유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유래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양력으로는 대체로 4월 5일쯤입니다.
청명은 음력 3월에 있는 24절기 중 다섯 번째입니다. '청명'이란 '하늘이 점점 맑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3월, 양력으로는 4월 5~6일쯤에 있습니다.
절기상 한식은 청명과 같은 날이거나 전후로 있기 때문에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매일반'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때로 연세가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라는 한탄이 섞인 속담을 말씀하시곤 하는데, 이 속담의 의미는 한식과 청명이 대체로 하루 차이라서 하루 일찍 죽거나 하루 늦게 죽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와 비슷한 속담으로 "돈긴 개긴이다"와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 "도토리 키 재기" 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4. 한식의 풍습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자손들이 조상의 묘 앞에 과일과 떡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식날은 '손 없는 날', '귀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로 여겨져 산소에 손을 대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상의 묘가 헐었거나 잔디가 상했을 때는 새로 흙을 덮거나 잔디를 입히는 등의 손질을 합니다. 한식날은 조상의 묘 관련 일을 하기 좋은 날이라고 예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영천 지역에서는 한식을 무탈한 날로 믿어, 이장이나 개사초와 같은 선영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한식날을 기다려서 합니다. 산소에 잔디를 새로 심고, 산소를 정리합니다.
해남군에서는 한식날에 자손들이 선산에 가서 성묘하고, 자손들의 복을 빌기 위해 허물어진 조상의 묘를 손질하고 떼를 입히는 개사초를 합니다. 또한 이날은 나무가 잘 자라는 날이라고 해서 선산이나 집에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한식날 비가 내리면 '물한식'이라 하여 그해 풍년이 든다고 점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3월 한식은 '불한식'이라 하여 개사초나 이장 등 산에서 흙 다루는 일을 절대로 삼가합니다.
해남군의 삼산면에서는 한식날 질병을 막고 풍어를 기원하는 습속이 전해져 왔습니다. 또한 한식날 콩볶음을 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거나, 기침병에 좋다고 알려진 진달래꽃을 따서 술을 담그기도 합니다. 한편, 어촌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집은 한식날 성주에게 밥을 차려 놓고 그해 어장이 잘 되기를 기원하기도 합니다.
송지면에서는 한식날 임자 없는 제사를 모시기도 하며, 문중에서는 시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산이면 대진리에서는 손이 없는 날이라 하여 한식날에 5대조 이상의 조상 묘를 찾아 시제를 모시는 집이 많습니다. 또한 이날은 묘를 이장하고 개사초 등의 흙 다루는 일을 합니다. '천하공명일'이라 하여 흙을 다루어도 아무 탈이 없다고 합니다. 한식 즈음에는 부녀자들이 꽃구경과 화전놀이를 많이 행하며, 이때는 쌀가루 반죽에 팥고물을 넣어 기름에 지져 만든 문지를 만들어 먹습니다. 꽃잎이나 쑥잎을 붙여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한식날에 떡, 과일, 나물, 술, 생선, 육고기 등 다양한 제물을 준비하여 산에 가서 묘 앞에서 제사를 진행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의 생곡 마을에서는 '한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성묘 시 도시락을 싸 가서 찬밥을 먹는 풍습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식을 지키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5. 마무리: 잊혀진 전통과 관습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화를 유지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데는 전통과 관습의 보존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에서는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 이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통이 현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한식이라는 다양한 풍습과 이야기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이 특별한 날을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절기 달력, 24 절기 양력, 음력( 2024) (0) | 2024.03.23 |
|---|---|
| 청명 한식 24절기, 유래, 3가지 속담 (0) | 2024.03.21 |
| 경주 벚꽃 개화시기 2024, 축제 명소 포토존 (0) | 2024.03.11 |
|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정보 일정 개화 시기 (2) | 2024.03.09 |
| 2024 서울 벚꽃 개화 만개 시기, 지역별 축제 (2) | 2024.03.08 |